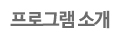교내 활동·심화학습 참가도 '성적 줄 세우기' 소외당하는 고교 중하위권 학생들
대입 지도·학생부 점검은 먼 얘기
관심 밖 대회서 들러리 서기도
서울 일반고 3학년인 D양도 혼자 대입을 준비하는 처지다. D양의 학교는 입학과 동시에 1학년 중 상위 30명을 뽑아 일명 '특별반'을
구성했다. 자습실을 따로 사용하게 하고, 각종 교내 대회나 특별 활동 참가 자격도 이들에게 먼저 줬다. D양은 "외부 대회도 상위권 학생들만
불러 준비시키더라"며 "중하위권 학생들은 그런 활동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도 많다"고 털어놨다.
심지어 최상위권의 성적 향상을
위해 학교가 학원비를 대주는 경우도 있었다. 지난해 서울의 한 사립 일반고에서는 교사들이 최상위권 3명을 불러 "사회탐구 점수가 조금 부족하니
학원 강의를 듣고 오라"며 수강비까지 내줬다. 이 학생들은 방과 후 학원에서 사회탐구 강의를 들었고, 그중 한 명이던 E군은 연세대에
진학했다.
◇성적 나쁘면 좋아하는 과목 공부할 자격도 없나
지난해 일반고를 졸업하고 명문대에 재학 중인
F군은 고등학교 시절 최상위권 학생들의 학생부만 점검해 주는 학교 때문에 가슴앓이를 했다. 내신 성적이 중하위권이었던 그는 동물 생태에 관심을
가지면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게 됐다. 국내에 없는 희귀 자료를 구하고 국내외 저명 교수들을 인터뷰하며 익힌 지식으로 책까지 펴냈지만, 학교
반응은 시큰둥했다. F군은 "학교 선생님들은 '명문대 진학이 보장된' 학생들만 모아 학생부를 점검하며 교내외 활동을 지도했다"고 말했다. F군
어머니 역시 "합격 발표 후 학교에 찾아갔더니 한 교사가 그제야 '왜 엄마가 더 적극적으로 학교에 어필하지 않았느냐. 그럼 더 나은 학교에
진학하게 도와줄 수 있었다'고 하더라"며 "반면 최상위권 학생은 스펙이 부족하면 교사들이 어떻게든 하나라도 더 채워주려고 노력하더라는 얘기를 그
아이들 학부모에게 직접 들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일반고 3학년 자녀를 둔 G씨는 "학교에 별로 기대하는 게 없다"고 말한다.
G씨의 딸은 지난해 성적이 나쁘다는 이유로 대학 전공 체험 프로그램에 신청서조차 넣지 못했다. G씨는 "대학 전공 체험은 교사 추천을 받아야
신청 가능한 경우가 많다"며 "딸아이가 선생님께 물어보니 성적 좋은 아이들로 이미 참가자가 결정됐다고 하더라며 무척 속상해했다"고 말했다. "고
2 초반은 얼마든지 성적 향상이 가능한 시기잖아요. 학교가 그런 가능성조차 무시한다는 사실에 아이도, 저도 충격을 받았죠."
일반고
3학년 자녀를 둔 H씨도 최근 학교에 적잖이 실망했다. H씨는 "딸이 사학과 진학을 꿈꾸며 고 1~2학년 때 한국사 수업에도 충실했다"며
"그런데 3학년 때 열린 한국사 심화수업은 (서울대 등 지원 가능한) 최상위권 아이들만 들을 수 있어 딸은 들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학교 측은 이런 현실에 대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일반고 교사인 I씨는 "명문대 진학 실적으로 학교 평가가
달라지는 상황에서 상위권 아이들 진학에 더 신경 쓸 수밖에 없다"며 "만약 상위권 아이들이 진학에 실패하면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일반고 교사 J씨도 "중하위권 학부모의 불만도 있지만, 상위권 학부모들은 특별 자습실에 매일 간식을 들여보낼 정도로 만족도가 높다"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학부모 H씨는 "오히려 성적이 낮은 학생을 이끌어줄 다양한 진로·진학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공교육의 도리'
아니냐"고 지적했다.